"돈은 빚이다" -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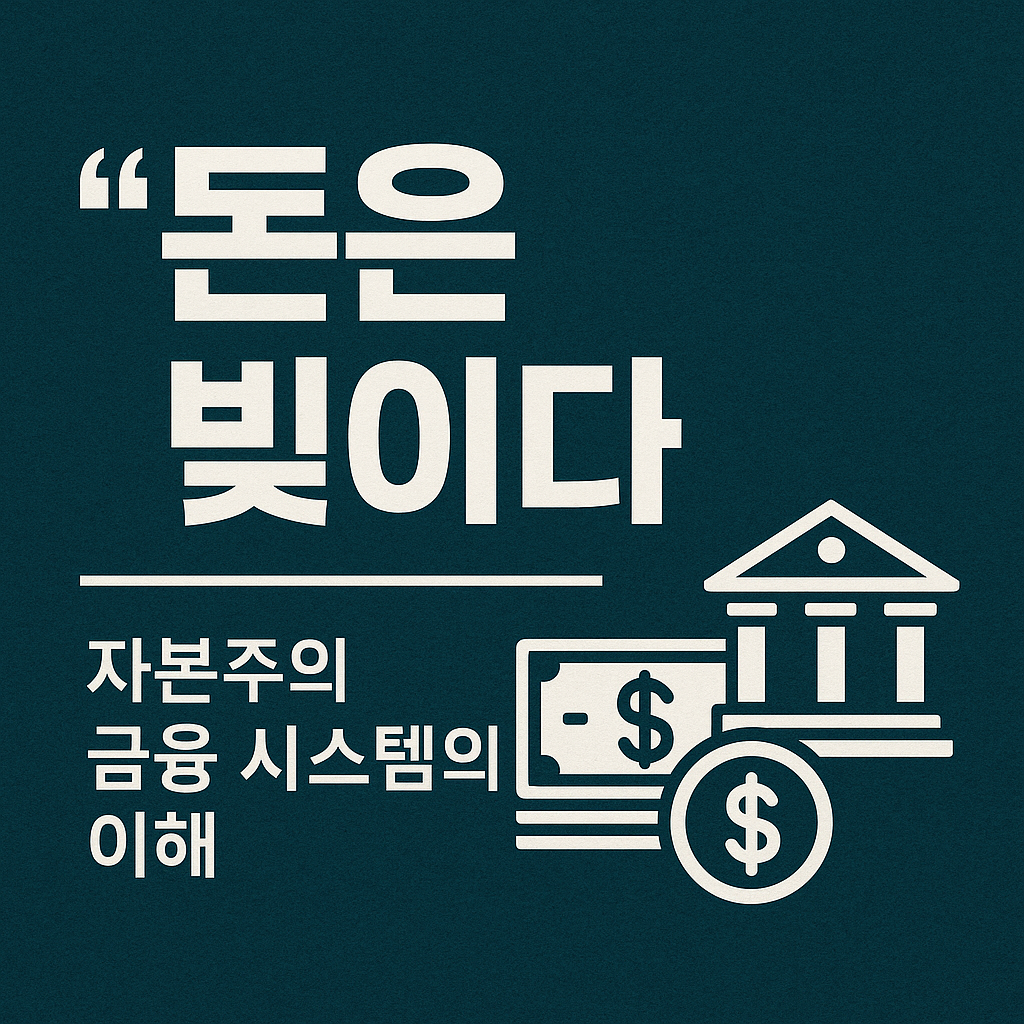
1. 개요: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의 본질 현대 사회는 '금융 자본주의' 세상이며, 이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한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이 브리핑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원리, 돈의 생성과 유통, 물가 상승의 원인,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특성 및 그 시사점을 다룬다. 특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영미권에서 시작되어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대동소이"하며 "돈이 도는 큰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깊음을 강조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2. 돈의 기원과 생성: 조폐공사와 은행의 역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조폐공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시중에 존재하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 '신용 창조' 과정으로 생성된다. 2.1. 부분 지급준비율(Fractional Reserve System) 정의: 은행이 예금된 돈의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정부와 약속한 비율이다. 이는 1963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업무 매뉴얼인 '현대 금융 원리'에 명시되어 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역사적 유래: 16세기 영국 금 세공업자의 사례에서 유래한다.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 보관증을 써주고, 이 보관증이 금화 대신 통용되자 실제 금고에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발행하여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았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돈의 증식 원리: 고객이 은행에 100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지급준비율(예: 10%)인 10원을 제외한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이 90원이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되면 그 은행은 다시 10%를 제외하고 81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무한 등비급수'처럼 돈이 계속 불어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한국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3.5%이다. 5천억 원이 은행 시스템에 들어올 경우, 대출을 통해 최대 "6조 6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이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돈이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불어나는 과정과 유사하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2.2. '신용 창조'의 본질: 돈은 빚이다 은행이 대출을 할 때마다 "새 돈이 생기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해야 새로운 돈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유한다. "지급준비율이 적을수록 은행은 더 적은 돈만 남기고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3.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3.1.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돈의 양 증가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만이 아니라,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지난 50년간 한국의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는 "기울기가 비슷"하며, 이는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인플레이션(Inflation): 통화량 증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돈이 많아지면 구매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금값 변화를 보면 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로 금 20온스를 살 수 있었지만, 2012년 2월 1일에는 1000달러로 0.58온스밖에 살 수 없었다. 가격이 "무려 40배나 올랐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돈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 짐바브웨의 2008년 초고액권 (100조 달러) 발행과 "2억 3천만 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은 통화 남발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사례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4. 중앙은행의 역할과 '이자'의 함정 4.1.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한국의 한국은행, 미국의 FRB)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권한을 갖는다. 이자율(기준금리) 조절: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량을 늘린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화폐 발행: 필요시 직접 화폐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4.2. '이자'의 근원적 문제: 빚의 보존 법칙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예: 1만원)을 시민이 빌리고 이자(예: 500원)를 포함해 갚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섬 전체에 유일한 돈은 1만원뿐이므로 "이자를 갚을 수 없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은행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갚으려면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이는 **'빚 보존 법칙'**으로 이어진다.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됩니다.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이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5. 경제 위기: 디플레이션과 콘드라티예프 파동 5.1. 디플레이션(Deflation) 인플레이션으로 통화량이 과도하게 팽창한 후,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디플레이션은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기업 위축, 생산 및 투자 감소, 대량 해고, 일자리 부족, 소비 위축 등 "누구나 싫어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며, 이는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5.2. 콘드라티예프 파동(Kondratiev Wave)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 "장기 순환 주기"가 존재하며, 그 주기가 "48년에서 60년 정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슘페터 또한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 명명하며 자본주의 경제가 "물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미국의 콘드라티예프 주기상 "겨울(하강기)"은 "2000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2007년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는 "디플레이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주택 가격 폭락과 금융 위기는 금융회사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모기지)을 해주면서 발생했다. 이는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빌렸고, 빌려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도 다 빌렸기" 때문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한국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과거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는 콘드라티예프 주기의 "여름(상승기)"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 취업난과도 연결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결과적으로 "갚아도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으며, "위기의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우리들 중 누구"가 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6. 달러와 국제 금융 시스템 6.1. 달러의 기축 통화 위상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는 "달러"이다. 한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수입을 위해 달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 미국 하는 것이 심하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브레튼우즈 협정 (1944년):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금융 시장 안정과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체결했다. 이 협정을 통해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내 주겠다"고 약속하며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켰고, 이로써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닉슨 쇼크 (1971년):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금 태환 요구가 많아지자, 미국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금 태환제를 철폐"했다. 이로써 달러는 "금과 무관"한 "종이 돈"이 되었고, 미국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6.2.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특성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곳은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닌, "몇몇 민간 은행들의 법인"인 "연방 준비 제도, 즉 FRB"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FRB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FRB가 달러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며, "바로 이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이로 인해 "몇몇 금융자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있는 것"이며, 전 세계는 "미국 금융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7. 결론 및 시사점 돈의 본질: "돈은 빚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빚은 돈입니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경쟁의 필연성: 돈이 빚에서 시작되고 이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이라는 의미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식: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우리는 "돈의 노예, 빚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숲을 보는 안목: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정책 변화를 예측하며,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현명한 대응: 현재는 디플레이션 시대에 가깝다는 점을 인지하고, 섣부른 빚을 내거나 과도한 소비를 지양하며 "스스로 중심을 잡고 판단"해야 한다. (Source: EBS 다큐프라임) 희망: "추운 겨울을 잘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올 테니까요." (Source: EBS 다큐프라임)



